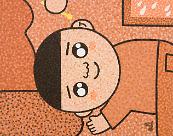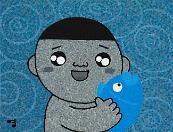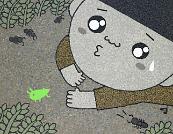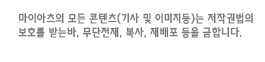글. 고경옥(이랜드문화재단 큐레이터. 예술학)
NEO POP + '꼬마영수'
팝아트는 진화하고 있다. 미국의 A. 워홀, R리히텐슈타인, C.올덴버그, 영국의 R.해밀턴으로 대표되는 1960년대 1세대 팝아트가 첫 출현한 이후,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포스트미니멀을 거친 요즈음의 맥락에서 나오는 또 다른 팝아트는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다. 넓은 의미에서 지금의 포스트 모던 시기에 팝을 다루지 않는 작가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팝아트는 특정한 시기, 지역, 사조에 한정되기 다는 재정의 되는 열린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현재진행형의 시대정신을 흡수하는 리트머스지와도 같다. 따라서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작업 양상은 시대를 반영하는 열린 개념으로서의 팝아트(NEO Pop)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팝아트는 1980년대 민중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를 거쳐 다분히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를 지니며 생성되었다. 캐릭터, 아바타, 키치, 애니메이션, 만화 등 다양한 하위문화와 결합한 근자의 팝아트는 다층성 혹은 혼성성을 통해 표현방식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것에서 드러난다. 사진과 회화, 구상과 추상, 디자인과 순수회화, 회화와 설치, 평면과 오브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캔버스와 컴퓨터 그래픽 등의 장벽이 어느새 허물어져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영수의 이번 작업은 전방위적인 팝의 생명력을 그대로 표현해 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회화, '꼬마영수' 캐릭터 제작과 이를 이용한 연출사진, 영상(애니메이션)의 작업은 증식하는 팝아트의 개념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이ㅏㄷ. 한지에 수묵으로 표현하였던 회화작업은 캔버스에 아크릴이라는 매체로 좀 더 밝고 화려하며 명랑한 색채를 입은 산뜻한 이미지로 각색되었다. 점묘를 통한 중첩의 채색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지만, 단순한 윤곽선은 감저을 배제한 팝아트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수묵작업이 유년의 회상이라는 서정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아크릴 작품은 동시대 삶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 어린 '꼬마영수'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출근길에 늦지 않기 위해 달리기를 하며, 매일매일 테옆을 감아 '오늘도 열심히!'를 외친다. 퇴근 후에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샤워를 하고, 맥주 한잔을 걸치며 잠시 휴식을 위하기도 한다. 또한 '꼬마영수'는 외국인 영어강사가 되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 땀 흘려 일한다. 이처럼 '꼬마영수'는 동시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셈이다.
'꼬마영수'캐릭터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사진으로 찍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놀이와도 같은 장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호모루덴스' 즉 예술의 기원이 원초적인 즐거움, 유희 그 자체에 있음을 말해 준다. '꼬마영수'는 캔버스에서 걸어나와 자연의 식물, 동물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 여행을 또나서 전 세계의 유명지를 관람하기도 한다. 꽃잎이 날리는 가운데 좋아라하기도 하고, 비오는 거리에 서서 고독을 달래기도 한다. 이런 '꼬마영수'는 할아버지가 되어 노을이 번지는 언덕에 앉아 과거를 추억한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꼬마영수'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 하늘을 나는 '꼬마영수'는 꽃바람을 맞기도 하고, 산을 건너기도 하며,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날기도 한다. <삶은 여행!>이라는 부제처럼 무겁지 않게 '꼬마영수'로 대변되는 보통인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에필로그
유년의 기억은 아름답다. 그리고 오랜시간동안 지속되낟. 많은 작가들에게 있어 유년의 기억은 작업의 모티브이라 마르지 않는 창작의 우물과도 같다. 이런 맥락에서 이영수 역시 작업의 모티브를 유년의 아름다웠던 기억에서 차용아였다. 이런한 유년의 기억은 각박한 현실에서도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치유의 장(場)인 셈이다. 작가는 '꼬마영수'라는 아이콘을 통해 동심을 포현하였으며, 어린 시절로 표상되는 순수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꼬마영수'라는 아이콘을 통해 동심을 표현하였으며, 어린 시절로 표상되는 순수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꼬마영수'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 영희과 같이 보통인의 대명사인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심의 표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삶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꼬마영수'가 진화(?)한 것이다. 하지만 삶을 얘기하는데 있어, 결코 무겁고 딱딱하고, 비장하지는 않다. 가볍고 피상적인, 달콤하고 우호적인 미적 감수성과 함께 사태의 표현질감에 천착한 문화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팝아트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
미술과 대중문화가 교차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는 그 영역을 자신만의 것으로 영토화하며, 그 각지점에다 시대를 관통하는 아이콘을 세우기 마련이다. 이는 때때로 외관상 무의미한 행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놀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러는 사사로운 경럼을 객관화라는 행위로 드러나기도 한다. 작업의 이즘을 분류하고, 이를 하나의 무리로 범주와하는 것은 나이브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으로 작가의 개별적인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대 문화현상을 자가만의 것으로 흡수해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이미지로 재생산해 내는 이영수 작가를 열린 개념으로서 팝아티스트라고 명명하고 싶다. '꼬마영수'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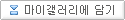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